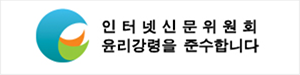사진=김한수 변호사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2022년) 24만 9,100명에서 23만명으로 19.1% 줄었으나, 혼인외 출생아는 전년 9,800명에서 1만 900명으로 1.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아 가운데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3.9%에서 4.7%로 올랐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 900명으로 늘었다. 혼인외 출생아 비율은 2013년 2.1%에서 2023년 4.7%로 10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라고 할 수 있다. 직접 아이를 출산한 모친과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나, 친부의 경우 친생자로 신고해야만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그 이후에 부친이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혼인외 출생자가 법률상 권리를 회복하려면 생부나 생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부(父)가 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자(母子)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기아(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하게 된다.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르면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독의 요식행위이다.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다.
임의인지든 강제인지든 출생 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친권, 양육, 부양, 상속, 유류분 등등 모든 법적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생부 또는 생모가 혼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를 해주면 갈등의 요소가 없으나 만약 이를 거부하면 혼외자, 혼외자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등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강제인지의 방법으로 법률상 자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심판청구 전에 우선 조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인지의 합의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조정인지라 한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할 수는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인지청구의 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외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혼외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부모 및 형제, 친인척 간의 감정적인 큰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혼외자의 인지 등 법적 권리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소송과 관련해 승소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시의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