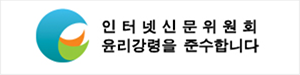사진=이용주 변호사
그런데 실제로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정도의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설령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편이다. 무고를 당한 사람은 순식간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명성이 실추되며 가족 등 주변 사람까지 비난에 시달리고 심지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억울한 범죄 혐의를 뒤집어썼을 때, 당사자의 결백이 밝혀진다고 해서 신고,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 과장이거나 핵심 범죄 사실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고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가 어렵고 설령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적다.
결국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허위라고 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무고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