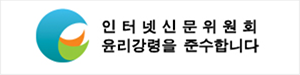이 책에는 작가의 기억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작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오늘이 아닌 과거의 어느 한 시점, 그 익숙했던 현실을 향해 조금씩 이끌려 간다. 작가는 아직은 늙었다고 볼 수 없는 나이다. 하지만 각 편에서 그가 산문시로 써 내려간 생생한 기억은 대부분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기억, 그는 이 기억의 조각들을 앞에서부터 뒤로 하나씩 하나씩 정교하게 소환하여 야무진 솜씨로 이어 묶었다.
각 편은 여러 개의 연으로 이뤄진 시다. 수많은 연이 하나로 모아져 서서히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문양을 형성해 간다. 이 문양은 대개 기쁨과 슬픔을 소박하게 한 줄로 꿰어 놓은 것이다.
작가가 회상하는 삶은 그리 멀지 않지만, 지금과는 매우 달랐던 과거이다. 작가는 옛 기억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소박한 생활의 요소를 꾸준히 응시한다.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있는 안내자가 되어 작가는 산과 들을 넘어 마을과 시장을 지나 시골집과 도시의 가난한 셋방으로 우리를 데려다준다.
독자들은 작가를 따라 집밖에 설치한 공동 화장실, 입김이 나오는 추운 단칸방, 매일 밤 방바닥에 깔고 아침이면 걷어야 하는 이부자리, 궁핍한 살림살이 등을 둘러보게 된다.
마치 연상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순간이 그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앞 순간과 연결된 또 다른 순간에 맞닿는다. 작가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속에 살던 사람들, 그를 돌보아준 사람들, 그를 동반해 준 사람들, 그를 가르쳐 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그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마저 애틋한 시선으로 회상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그의 서사가 이 산문시의 핵심이다. 그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상적이며 평범한 이야기가 그의 맑고 투명한 언급의 중심축을 이룬다. 독자들 가운데 그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책장을 하나하나 넘겨 갈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친밀한 순간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비밀이 된다
사람은 살면서 책이 된다
찾아가기 힘든 無名의 골목 어귀
세상을 잊은 고요한 도서관
그 깊고 깊은 서가에 꽂힌
표제 없는 책이 된다
사람은 살면서 그림이 된다
어린 시절 입은 상처가
누런 송아지 커다란 눈망울에 비치고
청춘의 꿈이 팽팽한 실오라기 한 줄
그 인력에 갇힌 가오리연으로 펄럭대는
까닭을 짐작 못 할 난해한 그림이 된다
사람은 살면서 숲이 된다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사연
단단한 껍질 속 열매에 담아
높디높은 나뭇가지에 매단 나무들이 된다
이름이 없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지도에 없어 가닿을 수 없는 산골짜기가 된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자기도 미처 알아채지 못한
수많은 아름다움을 숨긴 채
새벽녘마다 성글게 내려와
고단한 들판 덮어줄 흰 안개가 된다
[조재선 작가 소개]
1972년 서울 출생. 오랫동안 번역 작업을 했고 시와 산문을 쓴다. 『성심수녀회 역사』, 『발명이야기』, 『시몬 볼리바르』, 『라쉬의 작은 꽃들』, 『삶을 살리는 교육』, 『헬스케어 영성』의 역자이며 , 『마음 둔 곳』이라는 시집을 냈다.
[안재후 글로벌에픽 기자/anjaehoo@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