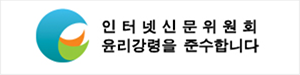사진=김효빈 변호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우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복직 또는 보상을 명령한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은 앞서 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용과 절차의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선호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부당해고 구제 제도를 활용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근로자가 아닌 자라면 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 계약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제 받기도 어렵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업무 도구와 자재의 제공,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통제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근로자가 그에 따라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일을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효빈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부당해고 구제 과정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형태나 계약 방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성 입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