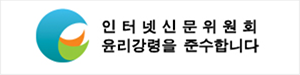사진=박새롬 변호사
대표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소한 오해나 연락 시도의 의도를 상대방이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면 고소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나 채무 독촉 등 과거에는 스토킹으로 인식되지 않던 행위가 이제는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거듭된 방문이나 연락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지속적·반복적 행위’와 ‘불안감 유발’을 두루 충족한다고 해석되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입건하는 추세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제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의도가 없는 연락’이었거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어 박새롬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과 ‘지속’은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진정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강력 범죄로 번지기 전 단계에서 엄중히 대처하자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취지에 따라 수사기관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를 초기에 강도 높게 수사하고, 법원 역시 잠정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채권 추심이나 단순 오해, 우발적인 감정싸움 등 본질적으로 스토킹과 거리가 있는 상황임에도 ‘반복된 연락’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법률 조력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겠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